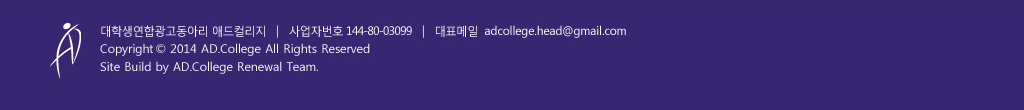뮤직비디오, 단편영화, 미니시리즈 등 광고 콘텐츠 확장… TV는 브릿지 구실
PPL을 아시는지? 특정 업종에서나 쓰이는 전문용어가 매스컴의 영향으로 대중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PPL이라는 용어도 그런 케이스다. PPL(product placement)은 드라마나 영화 등에 협찬한 특정 브랜드를 내용에 노출하는 것이다.
방송 드라마 제작과정을 다룬 드라마 <온에어>를 통해 이젠 누구에게나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왜 저 휴대폰을 저렇게 오래 비춰주지?’ ‘뜬금없이 왜 저 과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었던 분들은 궁금증이 모두 풀렸을 것이다. 드라마와 영화 제작 초기부터 PPL을 고려해 시나리오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으니까.
하지만 PPL은 드라마와 영화에 곁다리로 붙는 방식이다. 간혹 소비자단체에서 질타도 받는다. 이렇게 브랜드를 슬쩍 끼워넣는 방식이 과연 효과적인가 하는 의구심도 있다. 이쯤 되니 늘 새로운 광고방법을 찾는 것이 광고판의 생리인 이상, 좀더 강화된 PPL 개념이 도입됐다. 브랜드 엔터테인먼트(branded entertainment) 또는 브랜드 콘텐츠(branded contents)다. PPL이 숨어서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놓고’ 특정 브랜드를 중심에 놓고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경우가 애니콜의 ‘애니모션’이다. 뮤직비디오라는 콘텐츠를 애니콜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제품에 대한 선호를 이끌어냈다. 당연히 해외에서도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그동안 영화 ‘007시리즈’를 통해 신차를 선보여왔던 BMW는 2001년부터 총 8편의 6∼8분짜리 단편영화를 제작했다. <더 하이어>(The Hire)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는 인터넷으로만 상영되고 매편 리안, 왕가위, 오우삼, 가이 리치, 토니 스코트 등 유명 감독과 마돈나, 모건 프리먼 등 유명 배우가 등장한다. 대단한 운전 실력을 가진 전문 운전기사가 BMW를 타고 문제를 해결해나간다는 내용의 이 시리즈는 조회수 4천만 건이라는 놀라는 성과를 올렸다. 이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단편영화와 드라마 형태의 브랜드 엔터테인먼트를 내놓으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장진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소지섭이 주연한 액티온의 <유턴>(U-TURN)은 케이블 영화채널 OCN에서 방영됐다.
최근에는 류승범, 신민아, 현빈이 출연하는 <여름날>이라는 8편의 미니시리즈가 나왔다. 감독은 광고계에서 유명한 조원석 감독이고, 그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희열이 음악을 담당했다. 여피들의 소프트한 사랑놀음를 다룬 이 미니시리즈는 극장에서 시사회를 가졌고 현재 인터넷에서 상영되고 있다.
<여름날>에서 과연 제품은 언제 등장하는가? 주인공들은 늘 노트북을 들고 다닌다. X-NOTE가 가볍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 맨손에 폼나게 들고 다니고, 모든 에피소드에 노트북이 삼각관계의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한다.
이러한 브랜드 엔터테인먼트 시도들의 공통점은 TV를 중심 매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 5분이 넘는 이야기를 15, 20, 30초로 구성할 수 없다는 한계 탓도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매체환경의 변화도 그 원인이다. 통상 가장 넓은 커버리지를 갖는 TV가 중심이고 신문, 잡지, 라디오, 옥외 등은 보조 매체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광고계의 시각이다. 하지만 TV보다 인터넷을 더 오래 끌어안고 사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미디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졌다. 브랜드 엔터테인먼트에서 대부분의 TV광고는 내용의 일부를 노출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인터넷(또는 CATV나 극장) 등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매체로 유도하는 역할만 한다. TV가 광고판에서 ‘브리지’ 구실을 하는 날이 온 것이다.
글 : 송진아 (엘베스트 광고기획부국장)
출처 : 씨네21
일단 글쓴이의 이름이 송진아라는 사실에 한 번 놀라며.. ㅎ
씨네21 보다가 눈이 확 뜨이는 기사가 있더라구요.
사실, 맨날 인터넷이 새로운 매체다, 라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대체 어떻게 새로운 매체인지, 그리고 기존의 ATL 매체들은
어떤 식으로 새롭게 사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기사를 찬찬히 읽다보니, "브릿지"라는 말이랑 "광고를 광고한다"라는 말이
왜인지 와 닿더라구요.
여전히 TV는 파급효과가 큰 매체이지만
TV가 인터넷과 손을 잡음으로써 그 파급효과가 훠얼씬 커지는 거죠
아까도 라디오 듣다보니까, 라디오 광고에서 중요한 내용 나올 즈음에
갑자기 말이 끊기면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어쩌고" 하는데
그러고보면 라디오나 신문, 잡지 같은 다른 ATL 매체도 TV와 마찬가지로
광고를 광고하는, 브릿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시대는 변하고, 매체들은 자신의 모습과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격이나 용도는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세상에 적응해나가는 거겠죠.
광고도 매체도 사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