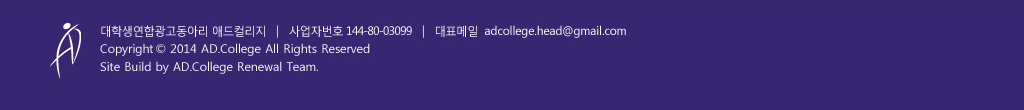참을 수 없는 ‘CF 변비 이야기’
2006-07-27 | 작성자 : 장은교 기자 | 출처 : 경향신문 | 조회수 : 118
엘비스 프레슬리는 변비환자였다. ‘절제’가 어울리지 않았던 로큰롤의 황제는 음식도 음악처럼 아낌없이 빨아들였다. 골고루 ‘배출’되지 못한 열정은 ‘변비’라는 고질병을 안겼다. 마흔 두 살, 변기 앞에서 쓰러진 엘비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떨까? 젊음의 광기를 마음껏 ‘분출’했지만 화장실에서는 배를 부여잡았던 그를 모델로 잡으려는 ‘광고쟁이’들에게 적잖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하루하루가 전쟁인 광고시장에서 ‘뭔가 보여주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장면 하나와 카피 한 줄도 유난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변비약과 발효유 광고를 만드는 광고인들이다. 그들의 애환을 들어봤다.
가장 큰 고민은 변비를 얘기하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줘야 하는 점이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예쁜 여성을 모델로 쓰는 것이다. 변비가 피부는 물론 몸매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용해 ‘변비를 해결하면 예뻐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델의 아름다움으로 상쇄한다. 변비약 ‘비코그린’에는 ‘콜라병 몸매’라는 별명을 가진 탤런트 김성은이 등장하고, ‘아락실’ 광고에는 슈퍼모델 출신 탤런트 송선미가 출연한다. 요구르트 ‘쾌변’은 몸짱미인으로 요가 열풍을 일으킨 가수 옥주현이 모델로 나섰다.
‘변비관련 광고모델은 미인’으로 여길 법도 하지만, 모델 섭외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요즘 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미지를 생명으로 여기는 연예인들은 여전히 ‘변비’라는 말만 들어도 출연을 꺼린다. 화장품 광고와 변비관련 제품 광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효과를 보여주기 힘든 것도 이들 광고의 어려움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도 부족할 텐데, ‘변비’라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추상적인 간접광고로 흐르기 쉽다.
부광약품 마케팅팀의 김향림씨는 “잇몸약은 갈비를 뜯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변비는 효과를 보는 장면을 보여줄 수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두통약은 머리가 개운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상처치료제는 말끔해진 피부를 보여줄 수 있지만 변비약은 ‘보여줄 거리’를 찾기 힘들다.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을 자전거로 내달리는 장면, 빠르게 내려가는 당구공, 시원하게 뚫린 스키로드 등으로 돌려서 표현한다.
변비약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심의과정도 까다롭다. 변비치료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속효성’이지만 ‘효과가 빠르다’는 말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고 비교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쓸 수 없다. 변비치료단계에서 중요한 ‘변의 풍부함’ 같은 단어는 ‘비호감 광고’로 가는 지름길이다.
걸리는 것이 많다보니 아예 ‘파격전술’을 쓰기도 한다. 요구르트 ‘쾌변’의 이름은 회사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변비에 좋은 요구르트라지만 식품 이름이 ‘쾌변’이라니. 파스퇴르 유업의 김기선 대리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효과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어차피 배변작용을 강조해야 하는데 빙빙 돌리느니 솔직하게 풀어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카피도 심상치 않다. 1탄 ‘안나오면 쳐들어간다’에 이어 2탄은 ‘사람들은 변하나봐’다.
파스퇴르 유업의 불가리스 광고는 화장실에서 볼 일 보는 장면을 내보내고 있다. 지퍼를 내리는 모습과 두루마리 휴지가 돌아가는 모습, 맨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물 떨어지는 소리도 예사롭지 않다. 광고를 만든 카피라이터 서성교 차장은 “모험에 가까웠지만 기존 광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시도했다”고 말했다. 커피포트에서 커피 따르는 장면, 믹서기로 간 액체가 떨어지는 장면 등도 있었지만 불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장이 나빠진 ‘광고쟁이’들도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한두개씩 발효유를 비웠다.
변비약은 변비약대로 발효유는 발효유대로 광고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약은 신뢰감을 줘야 하고 사실 여부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어렵고, 발효유는 식품이면서도 효능을 광고해야 하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것이다. 약이든 요구르트든 이들이 진정 뚫고 싶은 것은 막힌 장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 아닐까.
2006-07-27 | 작성자 : 장은교 기자 | 출처 : 경향신문 | 조회수 : 118
엘비스 프레슬리는 변비환자였다. ‘절제’가 어울리지 않았던 로큰롤의 황제는 음식도 음악처럼 아낌없이 빨아들였다. 골고루 ‘배출’되지 못한 열정은 ‘변비’라는 고질병을 안겼다. 마흔 두 살, 변기 앞에서 쓰러진 엘비스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떨까? 젊음의 광기를 마음껏 ‘분출’했지만 화장실에서는 배를 부여잡았던 그를 모델로 잡으려는 ‘광고쟁이’들에게 적잖이 시달리지 않았을까.
하루하루가 전쟁인 광고시장에서 ‘뭔가 보여주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장면 하나와 카피 한 줄도 유난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변비약과 발효유 광고를 만드는 광고인들이다. 그들의 애환을 들어봤다.
가장 큰 고민은 변비를 얘기하면서도 상쾌한 느낌을 줘야 하는 점이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예쁜 여성을 모델로 쓰는 것이다. 변비가 피부는 물론 몸매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이용해 ‘변비를 해결하면 예뻐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모델의 아름다움으로 상쇄한다. 변비약 ‘비코그린’에는 ‘콜라병 몸매’라는 별명을 가진 탤런트 김성은이 등장하고, ‘아락실’ 광고에는 슈퍼모델 출신 탤런트 송선미가 출연한다. 요구르트 ‘쾌변’은 몸짱미인으로 요가 열풍을 일으킨 가수 옥주현이 모델로 나섰다.
‘변비관련 광고모델은 미인’으로 여길 법도 하지만, 모델 섭외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요즘 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미지를 생명으로 여기는 연예인들은 여전히 ‘변비’라는 말만 들어도 출연을 꺼린다. 화장품 광고와 변비관련 제품 광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효과를 보여주기 힘든 것도 이들 광고의 어려움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해도 부족할 텐데, ‘변비’라는 소재의 특성 때문에 추상적인 간접광고로 흐르기 쉽다.
부광약품 마케팅팀의 김향림씨는 “잇몸약은 갈비를 뜯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변비는 효과를 보는 장면을 보여줄 수 없어 어렵다”고 말했다.
두통약은 머리가 개운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상처치료제는 말끔해진 피부를 보여줄 수 있지만 변비약은 ‘보여줄 거리’를 찾기 힘들다. 구불구불 이어진 산길을 자전거로 내달리는 장면, 빠르게 내려가는 당구공, 시원하게 뚫린 스키로드 등으로 돌려서 표현한다.
변비약의 경우 의약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심의과정도 까다롭다. 변비치료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속효성’이지만 ‘효과가 빠르다’는 말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고 비교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로 쓸 수 없다. 변비치료단계에서 중요한 ‘변의 풍부함’ 같은 단어는 ‘비호감 광고’로 가는 지름길이다.
걸리는 것이 많다보니 아예 ‘파격전술’을 쓰기도 한다. 요구르트 ‘쾌변’의 이름은 회사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변비에 좋은 요구르트라지만 식품 이름이 ‘쾌변’이라니. 파스퇴르 유업의 김기선 대리는 “논란이 있긴 했지만, 효과를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어차피 배변작용을 강조해야 하는데 빙빙 돌리느니 솔직하게 풀어주는 게 낫다는 것이다. 카피도 심상치 않다. 1탄 ‘안나오면 쳐들어간다’에 이어 2탄은 ‘사람들은 변하나봐’다.
파스퇴르 유업의 불가리스 광고는 화장실에서 볼 일 보는 장면을 내보내고 있다. 지퍼를 내리는 모습과 두루마리 휴지가 돌아가는 모습, 맨발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물 떨어지는 소리도 예사롭지 않다. 광고를 만든 카피라이터 서성교 차장은 “모험에 가까웠지만 기존 광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시도했다”고 말했다. 커피포트에서 커피 따르는 장면, 믹서기로 간 액체가 떨어지는 장면 등도 있었지만 불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장이 나빠진 ‘광고쟁이’들도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한두개씩 발효유를 비웠다.
변비약은 변비약대로 발효유는 발효유대로 광고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약은 신뢰감을 줘야 하고 사실 여부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이 어렵고, 발효유는 식품이면서도 효능을 광고해야 하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것이다. 약이든 요구르트든 이들이 진정 뚫고 싶은 것은 막힌 장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 아닐까.